
최근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보험부채 할인율이 현실화되면서 보험사들은 후순위채 등을 발행하며 선제적 지급여력비율(K-ICS) 관리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이미 예금보험료도 내고 있는데 굳이 미래 신사업 등에 투자할 돈을 들여 수치를 맞추는 것은 과도하다"며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11월 4일 25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수요예측에서는 10년 만기 5년 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조건으로 7970억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희망 금리밴드로는 3.7~4.4%의 고정금리를 제시해 4.17% 물량을 채웠다. 증액 발행 한도는 최대 4000억원이다.
롯데손해보험도 다음 달 1일 수요예측이 예정됐다. 10년 만기 5년 콜옵션을 조건으로 15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11일 발행할 계획이다. 증액한도는 최대 2000억원이며 금리는 최대 6.2%다.
지난달에는 동양생명이 2019년 이후 5년 만에 3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고 교보생명은 8월 7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보험사들의 연이은 후순위채 발행의 배경에는 지난해 새 회계기준(IFRS17)과 함께 도입된 K-ICS가 있다.
K-ICS는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당국은 각 보험사에 K-ICS 비율을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업계는 20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보험사의 K-ICS 비율은 217.3%로 생명보험사는 212.6%, 손해보험사는 223.9%다.
업계의 평균 K-ICS 비율은 모두 200%를 넘지만, 이는 일부 외국계 보험사들의 높은 수치로 발생한 착시다. 개별사 기준으로 보면 지난 2분기 들어 K-ICS 비율이 크게 하락한 보험사들이 많았다.
이에 보험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후순위채 등 자본성 증권을 발행해 K-ICS 비율을 맞추고 있다. 후순위채는 일반 회사채에 비해 변제 순위가 뒤로 밀려 신용등급보다 높은 금리로 발행되기 때문에 회사는 높은 이자의 부담이 발생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들의 후순위채 등 자본성 증권 발행이 이어지는 것은 건전성 관리보다는 K-ICS 비율을 맞추기 위한 선제적인 자본 확충"이라며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고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만 좀 지나친 경향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헬스케어나 요양사업 등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신사업이 많은데 굳이 수치를 맞추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쓰이는 것"이라며 "K-ICS 비율을 강조하고 있는 금융당국으로 인해 보험사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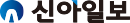

![[마감시황] 코스피, 외국인 매도에 하락…코스닥, 1.34%↑](/news/thumbnail/202411/1958277_1079648_5334_v1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