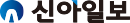어느 분야나 ‘세대차이’는 존재한다. 세대마다 자라온 환경은 물론 경험하고 배워온 것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MZ세대 역시 그렇다. MZ라고 붙이긴 하지만 1980년대에 태어난 M(밀레니얼)세대와 1990년대 중반 전후로 태어난 Z세대 간 차이도 분명 있다. M세대는 Z세대를 두고 상대적으로 더 뚜렷해진 ‘개인주의’에 혀를 내두른다. Z세대는 M세대의 ‘꼰대’ 같은 구시대적 발상이 부담스럽다며 동일선상에 놓이길 꺼려한다. 언론홍보도 마찬가지다. M과 Z 사이 12개의 스펠링이 있는 만큼이나 같은 홍보업무라도 접근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신아일보>는 창간 21주년을 맞아 유통업계 8090 홍보인들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이 느끼는 홍보의 매력은 무엇이고 반대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홍보 선·후배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지 알아봤다. 또 요즘 기자(매체)에 대한 생각도 들어봤다.
![[이미지=장유리 기자]](/news/photo/202405/1880681_1015266_3648.jpg)
80년대생 홍보담당자와 90년대생 홍보담당자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대목은 ‘홍보업무의 매력’을 묻는 질문이었다. 80년대생은 회사 메신저로서 기자들과 소통한 후 기사 흐름이 달라지는 데서 오는 성취감과 자긍심 등을 매력으로 꼽았다. 반면에 90년대생은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 전반에 대한 견해가 넓어지는 등 자기계발 기회가 큰 점이라고 답했다.
80년대-90년대생 홍보는 업무 고충의 지점도 달랐다. 80년대생은 사실과 다른 기사가 나왔을 때 특히 힘들다고 토로했다. 90년대생은 ‘워라밸(Work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이 지켜지지 않는 점을 홍보업무의 단점으로 봤다. 저녁 술자리의 경우 80년대생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90년대생은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이었다.
80년대생이 느끼는 90년대생 후배들의 모습, 90년대생이 바라보는 80년대생 선배들의 모습은 예상(?)보다 좋았다. 80년대생은 후배들의 유연성, 개성 등을 높게 평가했다. 다만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부족한 부분을 아쉬워했다. 90년대생은 선배들의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 등을 본받고 싶어 했지만 경직된 사고를 개선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유통 기자들과 관련해선 80년대생은 ‘비대면 소통’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90년대생은 ‘홍보를 배려해주는 모습이 좋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홍보업무를 하게 된 계기는 80년대생, 90년대생 각각 자원하는 것보단 ‘발령’이 2배 정도 많았다. 관련 전공을 한 경우나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경우 홍보 업무를 자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인으로서의 목표는 세대 상관없이 ‘대내외적으로 노력을 인정받으며 오랫동안 홍보업무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80년대생 홍보 "우린 회사 프론트맨…후배들 로열티 부족 아쉬워"
80년대생 홍보들은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 홍보업무의 장점이라고 답했다. 특히 최전선에서 기자들과 소통하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높이 샀다.
84년생 A사 B차장은 “회사의 경영전략이나 주요 의사결정을 이해할 수 있어 좋다. 대외적으로는 기자나 산업계 홍보팀, 대내적으로는 경영진부터 신입사원까지 소통할 기회가 많아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유리하다”며 “업무 특성상 논리력과 문장력이 강화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84년생 C사 D과장은 “회사의 주요 이슈를 외부로 알리고 소통하는 프론트맨으로서의 역할과 성취감이 가장 크다”며 “어떤 메시지와 전략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미디어와 대중이 받아들이는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80년대생 홍보들은 취재 시 설명과 실제 기사 내용이 다르거나 회사 입장이 기사에 반영되지 않을 때 애로를 느낀다고 밝혔다.
86년생 E사 F과장은 “기자들이 원하는 정보지만 현업에서는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인 경우들이 있다”며 “현업 담당자를 어렵게 설득해 기자에게 정보를 줬는데 당초 의도했던 기사 방향과 달리 부정 기사 등으로 나오게 되면 사면초가에 놓인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86년생 G사 H과장은 “회사 입장을 기사에 모두 반영해주지 못하는 상황을 이해하지만 가끔 정해진 답변만 요구하고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힘들다”며 “예상치 못한 일이 터져 공격적인 질문을 많이 받을 때는 체력적으로도 버겁다”고 말했다.
“사람 간 이뤄지는 일…술 한 잔하며 인간적 신뢰를 쌓고 친밀감 형성”
저녁미팅과 관련해선 대체로 필요하다는 게 80년대생 홍보 담당자들의 생각이다.
85년생 I사 J차장은 “술을 곁들이는 경우 식사만 하는 경우보다 친밀해지는 속도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때문에 세 번의 점심보다 한 번의 저녁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팀장이 돼 팀원을 채용한다면 저녁미팅 참석 여부가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84년생 C사 D과장은 “중장기적으로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관점에선 저녁미팅이 가장 효과적인 툴(수단)”이라며 “점심보다는 저녁이 좀 더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신뢰를 쌓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어서다.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 관계의 연속성과 시너지도 생길 수 있다”고 피력했다.
84년생 K사 L차장은 “기사 톤 다운과 같은 조율도 결국 사람 간 이뤄지는 일이니 서로에 대한 이해의 저변을 넓히는 게 필요하다. 공감대를 쌓는 측면에서 아직은 저녁미팅이 유효하다”면서도 “개인의 취향이 많이 다르게 나타나는 시대이기에 술 외에 다른 취미를 공유하는 자리 마련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80년대생 홍보들은 90년대생 홍보 후배들의 장점으로 유연성과 뚜렷한 개성을 꼽았다. 반면 소속감이나 유대감은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했다.
86년생 E사 F과장은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물론 기자들과도 유연하게 소통하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84년생 K사 L차장은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뛰어난 외국어 능력, 꾸준한 자기개발 등 개성이 돋보인다”고 밝혔다.
84년생 A사 B차장은 “홍보업무라는 게 어느 정도 희생과 로열티가 필요한데 이런 점이 부족해 아쉽다. 특히 퇴근 후나 주말에 연락이 잘 안 된다”며 “또 사람 만나는 게 일인데 그걸 어려워한다”고 아쉬워했다.
![[이미지=장유리 기자]](/news/photo/202405/1880681_1015271_3955.jpg)
80년대생 홍보들은 업계 출입기자들의 특성이 어떻냐는 질문에 비대면 소통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일부는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86년생 G사 H과장은 “연차가 비교적 낮을수록 통화나 만남보다는 텍스트로 소통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구두로 설명하면 이해나 납득이 빠를 수 있는데 텍스트로 하다 보니 톤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85년생 I사 J차장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모든 매체와 기자들을 세심히 챙기는 게 버거워지고 있다. 서운함을 부정기사 등으로 표출하지 않길 바란다”며 “대기업이 아니라고 무시하는 언론인이 간혹 있는데 서로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90년대생 홍보 "다양하게 만나며 관점 넓힐 기회…선배들 시대 흐름 못 따라가"
90년대생 홍보들은 홍보업무의 가장 큰 매력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이 확장되는 점을 꼽으며 자기계발하는 데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양한 분야의 기자, 홍보인들과 인맥을 쌓을 수 있다는 점도 홍보업무만의 특징이라고 봤다.
93년생 A사 B대리는 “홍보팀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회사 모든 부서의 현재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 마케팅 트렌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90년생 C사 D대리는 “홍보업무를 하려면 억지로라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한다. 때문에 경제·사회 이슈를 들여다보니 개인적으로 공부가 많이 된다”며 “다양한 사람과 만나 이야기 나누면서 관점을 넓힐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주장했다.
90년대생 홍보들은 ‘워라밸이 없는 점’을 홍보업무의 고충이라고 밝혔다. 특성상 점심·저녁 미팅이 많고 온앤오프(ON&OFF·일과 사생활 전환)가 없는 일이라 힘들다는 것이다.
94년생 E사 F사원은 “저녁미팅이 많은 업무 특성상 술을 마시는 일이 많다”며 “이로 인해 가족과 보내는 시간, 나만의 휴식 시간이 다른 직군보다 부족한 점이 고충”이라고 전했다.
94년생 G사 H주임은 “기사는 퇴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나오다 보니 항상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지내는 것 같다”며 “ON&OFF가 없는 일이라는 것도 홍보 업무의 큰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점심만으로도 충분, 잦은 술자리는 홍보업무 꺼리는 주 이유”
90년대생 홍보들은 저녁미팅에 대해 특성상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저녁미팅이 기자와 친밀도를 쌓고 향후 리스크 관리를 위해 도움이 되겠으나 점심미팅으로도 대체 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94년생 I사 J대리는 “개인적으로 술자리를 일의 성과로 여기고 저녁미팅을 필수적이라고 보는 것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대기업 홍보팀은 ‘술상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이런 소문들은 젊은 세대가 홍보 직군을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피력했다.
94년생 E사 F사원은 “저녁미팅을 점심미팅으로 대체 가능하다”며 “점심에도 약간의 술을 곁들인다면 충분히 친밀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90년대생 홍보들은 80년대생 홍보 선배들의 장점으로 ‘우수한 업무능력’을 꼽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바뀐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뒤쳐진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90년생 C사 D대리는 “긴 시간 홍보업무를 하면서 경험치가 쌓인 선배들을 보면 업계와 회사 전반에 대한 지식이 많다. 게다가 그걸 다른 이슈랑 연결 짓거나 재미있게 풀어내는 능력도 뛰어나다”며 “보도자료 하나를 작성하더라도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글과 말로 표현하는 것에서도 감탄한다. 선배를 닮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94년생 I사 J대리는 “80년대생 선배들은 직접 체득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언론과의 관계를 수월하게 해결한다”면서도 “다만 세상이 많이 바뀐 만큼 기사를 보는 독자의 시선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점이 아쉽다”고 주장했다.
90년대생 홍보들은 요즘 만나는 출입기자 특성을 묻는 질문에 홍보팀을 존중해준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부 기자들의 경우 답변을 재촉하거나 기삿거리를 요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91년생 K사 L대리는 “저와 나이가 비슷한 90년대생 기자는 홍보업무의 고충을 공감해주고 문의를 줄 때도 배려해주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며 “인간적으로 대해주려는 기자들이 많아 힘을 내서 홍보업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93년생 A사 B대리는 “언론이 익숙하지 않은 부서는 언론매체의 마감의 개념 역시 익숙하지 않다”며 “매체에서 기업에 문의를 줄때는 좀 더 깊이 있는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94년생 G사 H주임은 “개인적으로 기사에 대해 ‘뭐 좀 없느냐’는 식의 물음은 힘들다”며 “발제를 찾는 기자들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친하니까 정보를 흘러달라는 식의 접근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