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줌마, 근데 아줌마는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 좋은 사람은 아니야.”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매일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과 편지를 쓰고 있거든.”
타인을 향한 이해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룬 김혜진 작가의 장편소설 ‘경청’이 출간됐다.
7일 출판사 민음사에 따르면 2012년 등단 이후 2013년 첫 장편소설 ‘중앙역’을 펴낸 후 ‘딸에 대하여’를 비롯해 ‘9번의 일’, ‘불과 나의 자서전’ 등 7편의 소설책을 집필한 김 작가의 신작이 나왔다.
‘경청’은 그간 김혜진 소설이 천착해 왔던 주제, 즉 타인을 향한 이해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 의식과 맥을 같이 하지만 기존의 작품들과 전혀 다른 시선을 제공하며 세상과의 소통을 시도한다.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차단당한 뒤 인생이 멈춰 버린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번 소설은 빠르게 판단하는 것에 익숙해진 세상을 상대로 어떤 판단도 할 수 없는 침묵의 순간을 쌓는다.
인물이 변해 가는 사이, 세상을 판단하는 우리의 속도에도 변화가 시작된다. 경청의 시간이 온다.
주인공 임해수는 삼십 대 후반의 심리 상담 전문가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 자신할 뿐만 아니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날 이후, 신뢰받는 상담사 임해수의 일상은 중단됐다.
내담자들에게 자신 있게 조언하던 임해수의 자리 역시 사라진다. 지금 해수가 있는 곳은 모욕의 한가운데.
세간의 구설에 오르며 대중의 비난과 경멸의 대상이 된 것이 시작이었다. 그리고 차례로 이어진 퇴사 통보, 이별, 끝 모를 자기연민……. 일과 삶의 세계로부터 모두 추방된 임해수의 삶은 캔슬컬처의 면면을 보여 준다. 그녀의 존재는 한순간 세상으로부터 ‘취소’당했기 때문이다.
세상과 담을 쌓은 채 혼란에 잠겨 있는 임해수는 매일 밤 편지를 쓴다. 자신에게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며 ‘진정한 뉘우침’을 강요하는 사람들을 향해 쓰는 글이다.
사과인 듯 항의인 듯, 후회인 듯 변명인 듯, 그러나 그녀는 어떤 편지도 완성하지 못한다. 완성되지 못한 편지는 끝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 폐기되기를 반복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것은 자기연민과 자기합리화의 무한반복. 그 사이에서 스스로를 잃어 가는 모습은 독자들을 죄와 벌에 대한 심오한 질문과 마주하게한다. 어쩌면 가장 가혹한 벌이란 스스로를 벌해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밤마다 자신을 옭아매는 원망과 울분, 학대에 가까운 자기비하와 자기부정으로 전쟁이 벌어지는 임해수의 내면과도 같은.
한편 김혜진 작가는 201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치킨 런’이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어비’, ‘너라는 생활’과 장편소설 ‘중앙역’, ‘딸에 대하여’, ‘9번의 일’, ‘불과 나의 자서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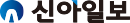

![[마감시황] 기관 매도세에 코스피 2500선 반납](/news/thumbnail/202501/1992671_1108667_5851_v1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