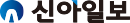2024년 마지막 날 무안공항을 향해 차를 몰았다. 연말·연초 정리하고 계획할 회사 일이 산더미지만 잠시 뒤로 미뤘다. 이번만큼은 직접 가봐야 할 것 같았다.
5시간 정도 걸려 해 지기 전 무안공항에 도착했다. 주차장은 물론 공항 주변 도로까지 차로 가득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사흘째 무안공항은 여전히 긴박하고 분주했다.
공항 관계자에게 물어 사고 현장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우선 이동했다. 저 멀리 처참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현장을 눈앞에 두고도 당장 뭔가를 할 수 없었다. 경찰 통제선 밖에 서서 타고 남은 여객기 꼬리를 그저 멍하니 바라봤다. 굳게 다문 입술을 뚫지 못한 탄식이 연신 굵은 콧바람으로 나왔다.
정신을 차리고 카메라를 꺼내 사진 몇 장을 찍었다. 마침 사고 현장 울타리 밖으로 경찰특공대원들과 과학수사대원들이 나온다. 이들은 사고 지점 주변을 꼼꼼하고 신중하게 수색했다. 표정은 진지하고 무겁다. 이를 함께 지켜보던 다른 기자들 얼굴도 굳어 있다. 기자들은 이따금 카메라를 들어 조용히 눈앞 상황을 기록했다.
1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사고 현장이 노을로 붉게 물든다. 2024년 마지막 해가 붉음을 뿜으며 작별 인사한다. 마음이 공허하고 아쉽다. 아무 죄 없는 해가 야속하기만 하다.
자리를 옮겨 다른 방향에서 사고 현장을 바라봤다. 아까보다 사고 지점과 멀었지만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 둔덕의 형태를 좀 더 잘 볼 수 있었다.
규정 준수 여부를 떠나 둔덕의 존재가 원망스러웠다. 안전을 지키고 사고를 막으려는 노력에는 정말이지 충분하다는 표현을 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 둔덕을 만든 이 중 누구도 이런 상황을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사고 전에는 아무렇지 않은 일이 사고가 터지고 나면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되곤 한다. 안전에 100%는 없다. 100번 강조해도 모자란다. 100명이 훨씬 넘는 희생자가 이 교훈을 다시금 일깨운다.
해가 완전히 자취를 감췄을 때 사고 현장을 뒤로 하고 무안공항 청사로 이동했다. 처음 마주한 건 유가족과 아픔을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다. 청사 안팎에서 유가족과 봉사자들을 위해 식사와 차, 간식, 각종 생필품을 제공하고 있었다. 왠지 모를 미안함이 몰려왔다. 같은 국민으로서, 그리고 기자로서 미안했다.
조심스럽게 무안공항 1층과 2층을 둘러봤다. 유가족을 인터뷰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다. 그냥 보고 느끼고 공감하려 노력할 뿐이다. 이번 취재에서 입은 거의 쓰지 않았다. 눈과 귀, 그리고 코의 감각을 최대한 열고 상황을 살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리고 코로 느껴지는 이 공간의 분위기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유가족들은 차분하려 애쓰는 모습이다. 그래도 한 번씩 밀려오는 애통함은 억누르기 어렵다. 유가족을 살피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썼지만 이런 가벼운 글로는 차마 표현할 수 없다.
나중에 알았지만 온라인에는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하는 악성 글과 영상이 돌았다. 근거 없는 루머도 있다. 아픔을 나누고 희망을 불어넣는 따뜻한 마음이 대부분이지만 이런 상황에도 비정상은 등장한다. 백 마디 위로보다 한 마디 조롱이 더 깊이 유가족 가슴에 남지 않을까 걱정이다. "조금이라도 마음 쓸 가치 없는 비정상에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해 주고 싶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사고만큼이나 처참한 우리 사회의 그늘이다.
무안공항을 찾았던 그때나 책상에 앉아 글을 쓰는 지금이나 머릿속을 채우는 건 한 가지 질문이다.
'이 상황에서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당분간은 이 질문에 답을 찾는 데 집중하려 한다. 이번 사고는 희생자와 유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데는 언론의 책임 역시 크다.
*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