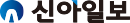공화당의 트럼프와 민주당의 힐러리가 경쟁을 하고 있는 미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대권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영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미 대선을 향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기자가 금융담당 기자이다 보니 방위비라든가 인권의 문제보다 금융과 관련한 사안에 관심이 깊을 수 밖에 없고 금융과 관련한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번 미국 대선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대결의 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공화당의 후보인 트럼프는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 최대의 부동산 재벌이다.
트럼프가 부동산 사업으로 지금의 부를 일군 것은 트럼프 개인의 사업수완이나 노력 등이 가장 중요했겠지만 빼 놓을 수 없는 사건이 두 차례에 걸쳐 미국 법원의 파산보호를 받은 사건일 것이다.
트럼프는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법원의 파산보호를 받았었고 대선에 출마하지 않았다면 세 번째 파산보호를 신청할 계획이었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였다.
쉽게 말해서 트럼프는 미국 금융기관의 돈을 엄청나게 많이 떼먹었던 사람이고 한 번 더 떼먹을 준비를 했던 사람으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악의 축의 한 갈래인 인물인 셈이다.
미국의 월가(街)에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그에 반해 미국 정치인 중 금융기관들로부터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많은 후원금을 받고 있는 힐러리는 월가의 대변인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금융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이 되기 전, 클린턴의 부인이자 영부인 시절의 힐러리는 미국의 금융기관에게는 저승사자와도 같은 인물이었다. 클린턴 행정부 말기(2002)의 일이다.
당시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은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사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엄청난 정치자금을 받았기 때문) 파산제도를 채권자 이익 중심으로 개정했다.
마지막 대출 3개월 이내 파산신청 금지 조항이나 파산신청 전 소비자 상담 의무화 등의 독소조항이 담긴 파산법안은 의회를 통과해 백악관에서 클린턴의 결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때 힐러리가 나서서 개정된 파산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클린턴에게 요청한다. 개정된 파산법이 지나치게 채권자에게 유리해 미국의 소비자들을 금융노예로 만들고 미국 시민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임기말이었던 클린턴은 더 이상의 정치자금이 필요 없었기에 힐러리의 주문대로 개정된 파산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5년, 클린턴의 거부권으로 인해 휴지조각이 됐던 파산법이 법조문 하나 바뀌지 않은 채로 힐러리에 의해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
당시 초선 의원이 된 힐러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정치인이 되어 있었다.
개정된 파산법에 의해 채무자에게 돈 떼일 걱정이 줄어든 금융기관들은 서브프라임(sub-prime) 모기지론을 마구잡이로 뿌려댔고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하게 됐다.
어찌 됐든 한 달이 지나면 앞으로 4년간 미국을 움직일 대통령이 결정된다.
파산제도가 가진 자들과 가지지 않은 자들의 정치적 힘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임을 감안할 때 이번 미국의 대선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역할이 뒤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김흥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