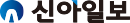천안의 봄은 탱글탱글한 하늘빛으로 여물어가고 있었다. 이곳의 늦봄은 학생들로부터 오는 듯했다. 이한우 화백을 찾아가는 길가에는, 물망초같이 싱그런 대학생들이 허리를 젖히며 까르르 웃어대며 떠들고 있었다. 노(老)화백이 사는 곳을 가려면 거쳐야 하는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며 백석대학교 앞거리는 그야말로 청춘지대여서 이방객의 눈이 부셨다.
이화백은 요즘 서울 홍은동 저택을 떠나 백석대학교 뒤편 저수지 앞에 집을 마련하고 소일하고 있다. 그러나 은거한다는 표현이 적당할 듯싶다. 집에는 개 3마리와 부인, 그리고 아들내외도 함께 살고 있었으나 고즈넉한 느낌이었다. 그의 홍은동 저택도 그러하거니와 이곳에도 온실과 텃밭이 딸려 있어 몇 가지 푸성귀는 자급자족하고 있다.
수인사를 나누자마자 이화백은 대뜸 2층으로 방문객을 안내했다. 유리문을 밀치고 나무계단을 올라가자 곧바로 그의 서재가 보였다. 햇살이 잘 드는 서재에서는 창문을 통해 바깥세상 구경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벽에는 그의 젊은 시절 사진이며 초청장, 기념액자 등이 걸려 있었고, 문갑 위에는 각종 석상들이 눈에 띄었다. 왼편으로 접어들자 응접실이 있었고, 그 안으로 들어가자 대작업실 및 전시실이 나왔는데 대작 수십 점이 한 눈에 들어왔다.
이화백은 곧장 그림들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그러나 다소 어눌한 말투의 상식적인(?) 말들이 이어지자 기자는 우선 사진부터 찍자고 청했다. 뜬금없는 기자의 청을 그는 선뜻 들어주었다. 그런데 그의 포즈가 너무 경직된 느낌이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영락없는 증명사진이 될 참이었다.
“이화백님, 좀 웃어 주세요.”
노화백은 그제야 다물었던 입을 약간 열고 미소를 지어보였다. “아니 좀 더 크게요.” 그러나 그의 입은 더 이상 크게 열리지 않았다. 서툰 곡예라도 하듯 그림 앞에서, 응접실 소파에서 그리고 서재에서 연방 셔터를 누른 끝에 겨우 몇 장을 건진 듯했다. 나중에 인터뷰를 끝내고 나서 정원과 텃밭, 그리고 온실에서도 사진을 찍었으나, 낯선 손님을 보고 어서 나가라는 듯 ‘컹컹’ 짖어대는 3마리의 개들 때문에 카메라 렌즈가 바르르 떨려왔다.

아무튼 응접실에서 주스 잔을 앞에 놓고 인터뷰가 시작됐다. 기자는 마침 앞에 걸린 그림-그냥 바닷가 풍경이라 했다- 하나를 본 감상을 전할 겸 이렇게 물었다.
“바닷가 풍경이 에메랄드빛 창해의 모습이 아니고 검푸른색인데요? 혹시 피카소…?”
그 그림에서 기자는 피카소의 청색 시대(Periodo Azul)를 떠올렸던 것이다. 이 시기에 피카소는 주로 검푸른색이나 짙은 청록색의 색조를 띤 그림으로 존재에 대한 불안함을 나타냈다.
“통영 바닷가 그림인데요(그는 통영에서 태어났다), 사실적 표현보다는 색을 통해서 어린시절 맛봤던 이미지를 표현해 내보고 싶었어요.”
“조금 우울하셨었나 봅니다?”
“하하 그런 건 아니고요. 자연에서 즉흥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느 순간에 본 색이지요.”
“바닷가로 이어진 땅, 저게 논인가요? 밭인가요? 하여간 그 색도 황토색이 아닙니다. 그냥 누런색이군요. 이화백께서 즐겨 쓰시는 황토색이 아니라서 좀 낯선데요?”
“그렇네요. 내 그림에서 황토색은 우리 민족과 민족성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이 역시 에메랄드빛 대신 검푸른색을 쓴 것과 유사한 이유 때문 아닌가 해요.”
“청색시대의 피카소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다른 색을 통해 온화한 색조를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화백께서도 그러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 그림의 대부분은 온화한 색조를 가지고 있지요. 난 원래가 온화한 한국의 색을 찾아 나섰어요.”“그게 오방색인가요? 일부 평자들은 이화백님의 기조색이 오방색이라고 하던데요?”
“그건 잘못 알고서들 그리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어조에는 난감함이 서려 있었다. 대한민국 평자들 중 일부는 작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작품을 해석하고 재단을 해대기도 한다. 이화백은 그 점을 좀 불편하게 여기는 듯 싶었다.
“오방색이 주조는 아니고요. 우리 민족성과 고향 땅, 이런 것들이 어린시절부터 감득되어 있다 보니 저절로 찾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옛 풍경들이야 오방색으로 피어나지요. 방방곡곡 어디서나 만나는 색들 아니겠습니까? 내 그림들 속에 오방색이 조금씩 자리하고야 있겠지요. 하지만 일부러 오방색을 찾아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에 대한 압제와 연관된 문제는 내성(內省)의 한계를 보여준다. 철학이 응축된 내성만으로는, 탐구의 방향이 어긋날 수 있는데다가 얼마 못가서 그 한계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빛과 색이 어우러지는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마음은 비로소 세상에 대해 눈을 뜰 수 있는 법이다. 이한우 화백의 내성은 오방색 그 자체에서가 아니라, 자기 바깥의 현상들까지도 보듬는 넓이와 깊이를 가진 민족의 색으로서의 오방색을 통해 피어오른다.
그래서 그의 그림은 서양화로 분류되지만, 우리 토착 정서가 노구솥의 누룽지처럼 달라붙어 있다. 그 스스로 “나는 유화로 우리 그림을 그린다”고 말한다. 단지 린시드유나 아교 등 교착제(膠着劑)를 사용하는 것만 서양화를 닮았지, 그 속에 담긴 정서나 방식은 우리 것이다. 신속함과 분방함, 미묘한 명암의 변화 등을 능숙하게 처리하여 표현을 더 잘해 보고자 서양화 방식을 차용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한우 화백의 초기 그림들을 보면 세밀화가 대부분으로 그 정교함은 사진을 찍어 놓은 듯하다. 그러나 반추상에서 추상으로 이어지면서, 그의 그림들은 대담한 생략과 과장 혹은 축소로 표현의 극점을 향해 달린다.
그는 세심한 소묘를 통해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혹은 몇 번의 붓칠을 거듭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그림에 가까워지게 됐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에게 붓터치는 그림을 표현하기 위한 종속적 요소가 아니라 그림의 본질적 요소로 승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