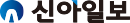정부는 2019년 고용이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인 일자리 반등의 해였다면서 취업자,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양적 측면에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월평균 취업자 수는 2년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했고 고용률은 60.9%로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3.5%로 2006년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
분명 환영할만한 성과지만 마냥 웃을 수만도 없다.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는 금방 드러난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사상 최대로 늘어난 반면 40대 취업자는 28년 만에 최대로 감소하는 등 명암이 엇갈렸다. 초단시간으로 분류되는 1〜17시간 취업자가 역대 최대로 늘어난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IMF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1998년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일자리의 양적 개선을 가져왔지만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경제에 유익한 일자리 증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런 수치만의 일자리 개선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입으로 만들어낸 결과이고, 전년도 바닥 수준이던 일자리에 대한 일종의 기저효과도 작용됐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통계가 일자리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문재인 정부로서는 고무적일 수는 있다. 경제성장률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2%에 그치고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악재를 감안했을 때 나름대로 선방한 결과라고 위안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최악이다. 취업자가 60대에서는 37만7000명이 늘은 반면, 30대와 40대는 각각 5만3000명과 16만2000명이 줄었다. 사회의 중추가 돼야할 30, 40대의 좋은 일자리는 감소하고 60대 이상의 단기성 일자리만 급증했다. 4년째 100만 명을 웃돌고 있는 실업자 수도 여전하다.
더 큰 문제는 올해도 일자리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조짐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도 적극적 재정투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그 방법은 한계에 부딪쳤다. 원래 경제가 극심하게 가라앉아 민간의 고용여력이 떨어졌을 때 정부는 재정확대 등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구원투수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일자리 만들기의 주체가 돼야 할 민간은 뒷짐을 지고 정부만 재정확장으로 단기성 일자리를 만드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다.
지난해 일자리 개선의 성과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다. 단지 정부의 올해 일자리 정책은 양적 개선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의 자발적 투자와 참여를 이끌어낼 정책도 절실하다. 정부는 단기성 일자리 만들기보다 민간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