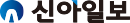![상반기 퇴사 현황. [이미지=사람인]](/news/photo/202306/1718475_877033_2016.jpg)
경기 침체에도 ‘대퇴사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인 HR연구소는 16일 기업 347개사를 대상으로 '2023 상반기 퇴사 현황'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46.1%가 전년 동기 대비 퇴사율이 '비슷하다'고 답변했다. '늘었다'는 응답은 27.1%로 '줄었다'는 답변(26.8%)보다 0.3%p 높았다.
직원 퇴사는 기업 규모와 업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100인 이상 기업은 '늘었다'는 답변이 30.9%로 100인 미만 기업(24.5%)보다 6.4%p 높았다. 업종별로는 3~4차 산업인 '유통·IT·바이오' 업종(30.3%)이 2차 산업인 '제조·건설'(23.5%) 보다 '늘었다'는 응답이 6.8%p 많았다.
구간별로 본 상반기 월평균 퇴사율은 과반인 55.3%가 '1~10%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1% 미만'(31.7%), '10~20% 미만'(8.4%), '20% 이상'(4.6%) 순이었다.
직원 퇴직 사유는 절반 이상이 '다른 직장으로 이직'(57.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연봉, 직무 변경 등 근로조건 불만족'(24.8%), '본인 및 가족 신상 관련'(7.2%), '휴식'(4%), '구조조정 등 회사 관련 사유'(3.5%)가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 기업 10곳 중 6곳(58.8%)만이 결원을 모두 충원한다고 밝혔다. 4곳(41.2%)은 '충원하지 않거나, 정원을 줄여 일부만 충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재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진 글로벌 경기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풀이다.
모든 직원을 충원하지 못한 기업은 그 대책으로 '업무 축소 및 효율화'(27.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잔업 야근 등 재직자들을 추가 투입'(26.6%), '조직 및 직무 개편'(25.2%), '임시직 고용'(11.9%), '업무 아웃소싱'(4.9%)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