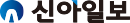한 편의 시(詩)를 지으려면 몇날 며칠 동안을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하며 밤을 하얗게 새워 겨우 몇 줄의 시를 완성하게 된다. 그리해 한편의 시는 고뇌의 산물이며 고통의 육즙이라해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니다.
시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지만 특히 사회풍자시는 사회성이 짙어 읽고자 하면 간혹 속이 후련 해 질때가 있다.
조선 중기 광해군 시절 곧은 성정으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해 권력과 정치를 풍자하는 시를 썼다가 임금의 노여움을 사 가혹한 고문을 받고 귀양가는 다음날 죽은 석주 권필(石洲 權韠, 1569~1612)의 시가 단연 으뜸이 아닐 수 없다.
그는 당대 뛰어난 문필가로 손꼽히며 절창(絶唱)의 시를 후세에 남긴 인물로 송강 정철의 문인이었으며 촉망을 받았다.
자는 여장(汝章)이며 석주(石洲)는 그의 호이다.
명산대찰을 유람하며 승려들과 나눈 시문이 여러 편 후세에전할 뿐 아니라 차를 즐겼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자유로운 기질의 소유자로 얽매임을 싫어했다. 한때 가난을 염려한 동료들의 추천으로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임명됐지만, 상부에 예를 갖추지 않은 채 곧바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런 기질과 “관대를 하고 예조에 나아가 예를 갖추라”는 말에 “그런 일을 잘 못한다”고 하고 벼슬을 그만두었던 처세는 이미 세상과 동떨어진 생애를 살았던 그 다운 일면을 드러낸 셈이다. 도연명의 기개를 닮아서일까 아니면 그가 살았던 시대가 난세였기 때문일까. 그가 살았던 시대는 광해군의 비였던 유씨 일족들이 권력을 전횡하던 시절이었다. 특히 유비(柳妃)의 오라비 유희분(柳希奮)의 전횡은 도를 넘었다.
그러므로 임숙영(任叔英)이 책문(策文)을 지어 유씨 일가의 방종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과거에 떨어지는 변고가 생겼다. 이로 인해 세상의 의기 있는 선비는 비분강개했다.
권필의 ‘궁류시(宮柳詩)’는 이를 배경으로 지은 풍자시다.
"궁궐 버들 푸르고 꾀꼬리 어지러이 나는데 성안에 가득한 높은 사람 봄 햇살에 아첨하네 조정에서 함께 태평의 즐거움을 축하하는데 누가 바른말 해 평민으로 쫓겨났나.”
궁중 안의 버들은 광해군 비 유씨 친족들을 은유한 것이다.
아첨하는 조정의 대신들이야 태평성대를 감축했지만 결국 이는 거짓일 뿐.
세상이 어지러울 때 위언(危言)은 충심을 품은 선비의 도리이다. 바로 임숙영은 충간(忠諫)으로 평민이 된 동량(棟樑)이었음을 풍자하고 있다.
권필은 이 ‘궁류시(宮柳詩)’로 모반에 연루돼 광해군의 친국을 받았고 귀양하던 길에 그를 동정하던 사람들이 주는 술을 거절하지 않고 마셨으니 결국 그의 죽음은 폭음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진정 술을 이기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시대의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떠난 것일까. 난세의 옹졸함은 강개한 인물을 시들게 하는 함정인 듯하다.
우암 송시열은 그의 ‘묘갈명(墓碣銘)’에 “시재가 뛰어나 자기성찰을 통한 울분과 갈등을 토로하고, 잘못된 사회상을 비판 풍자하는 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누가 개에게 뼈다귀 던져 뭇 개들 사납게 저리 다투나 작은 놈 꼭 죽겠고 큰 놈도 다치리니 도둑은 엿보아 그 틈을 타려 하네 주인은 무릎 안고 한밤중에 흐느끼니 비에 담도 무너져서 온갖 근심 모여드네.”
개싸움이란 풍자시가 읽히지 않을 세상은 언제나 도래 할까나.
오늘날 정치 권력의 다툼을 보면 아직 요원하기만 할 따름, 석주 권필은 올곧은 선비였으며 국난에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의지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대궐에 나아가 상소했던 일이나 일본과 화의(和議)를 주창하며 임금에게 아첨한 정승의 목을 벨 것을 요청했던 것에서도 이미 확인된다.
/탄탄스님 자장암 감원·용인대 객원교수
※외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