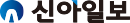‘미투(Me too‧나도 당했다)운동’이 활성화됐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성폭력 2차 가해에 대한 보호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이 연이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통념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11월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모은 사례중에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이름이나 주소, 직업 등 신상이 노출되거나, “여성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가해자가 도리어 피해자에 명예훼손 등의 법적 책임을 묻는 역고소도 대표적인 성폭력 2차 피해 중 하나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의 김보화 책임연구원은 “성폭력 혐의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나 관련 소송에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정보 등이 ‘기획적’으로 조장된다”며 “성폭력 사건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역고소 할 경우 법률 대리인들은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 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보호에 치우쳐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언론들이 성폭력 관련 취재 시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피해자 인터뷰 시 지나친 혹은 불필요한 사실 확인을 하는 것 △성폭력 통념에 근거해 질문하는 것 등으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것도 성폭력 2차 피해에 해당된다.

이처럼 성폭력 2차 피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모두 피해자를 물질적‧정신적으로 위축시켜 피해 사실에 대한 정당한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차 피해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게 성폭력 정책의 핵심”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 정부와 정치권, 법조계, 수사기관 등에서는 성폭력 2차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앞다투어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12개 관계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는 성폭력 근절대책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악성 댓글에 법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가해자의 역고소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의 폭로에 대해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법 해석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 표준조사모델 개발 TF팀’을 만들어 성폭력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대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언론계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2014년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공동으로 제작한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를 올해 미투운동 등의 현상에 맞춰 개정하고, 이를 보도 가이드라인으로 지정해 배포했다.
전문가들은 뒤늦게나마 성폭력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성폭력을 바라보는 왜곡된 사회적 통념을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한다.
한 성폭력 상담 전문가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정도의 용기로 피해 사실을 폭로한다는 점을 사회 구성원들이 인식해야 한다”며 “성폭력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거나 진실을 왜곡하기 보다는 피해자의 용기 자체를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