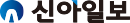‘인사동시대’를 연 신아일보가 창간 20주년(2023년)을 시작으로 ‘문화+산업’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칼럼을 기획했습니다. 매일 접하는 정치‧경제 이슈 주제에서 탈피, ‘문화콘텐츠’와 ‘경제산업’의 융합을 통한 유익하고도 혁신적인 칼럼 필진으로 구성했습니다.
필진들은 △전통과 현대문화 산업융합 △K-문화와 패션 산업융합 △복합전시와 경제 산업융합 △노무와 고용 산업융합 등을 주제로 매주 둘째, 셋째 금요일 인사동에 등단합니다. 이외 △취업혁신 △서민기업이란 관심 주제로 양념이 버무려질 예정입니다.
한주가 마무리 되는 금요일, 인사동을 걸으며 ‘문화와 산책하는’ 느낌으로 신아일보 ‘금요칼럼’를 만나보겠습니다./ <편집자 주>

아마도 한번쯤은 누군가의 연주를 듣다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때론 고혹적인 음색을 가진 가수의 노래일 수도 있고 어느 화가의 그림에서 온몸을 요동치게 만드는 에너지를 경험했을 수도 있다. 그 순간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감동이라는 말로 표현하기엔 부족함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감동 이상의 감동? 도대체 어떤?
오케스트라에서 잔잔히 울리는 바이올린 사이로 내리치는 퍼커션(percussion)처럼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에 뇌가 놀라는 것인가? 뇌과학자는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 중 하나가 영화에서의 반전이 그렇다. 반전 영화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식스센스(The Sixth Sense, 1999)의 마지막 장면은 모골(毛骨)이 송연(悚然)해지기까지 한다. 나의 예상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놀라움의 크기는 커진다. 크레센도(crescendo), 디크레센도(decrescendo)와 같은 악상기호가 주는 예측 가능한 변화와는 결이 다르다. 가냘픈 음색으로 시작되는 어느 가수의 노래가 정점에서 고음부(高音部)를 저격할 때면 어김없이 교감신경의 지시에 따른 입모근(立毛筋)의 반사인 ‘소름’이 돋는다. 여러 사실을 통해 찾아낸 ‘원인’은 바로 변화(變化)였다.
하나의 작품 안에 인생이, 삼라만상(森羅萬象)이 담겨 만들어지는 이러한 ‘변화’들이 청중을, 관객을 매료시키고 울림을 준다. 완성된 작품에서 느끼는 희열도 크지만 그 ‘변화’의 과정을 담은 영상은 또다른 경이로움을 선사해 준다. SNS상의 수많은 영상들이 이미 증명해주고 있다.
글씨도 예외가 아니다. 필획의 변화무쌍함을 최고로 보여주는 추사 김정희의 대표적 작품 중 하나인 대련 '고목석양'을 굳이 예로 들지 않아도 획(劃)은 길고 짧고 굵고 가늘고, 배가 꺼진 듯 오목(仰)하고, 꼿꼿하고 편평(平)하기도 하고, 때론 배부른 듯 불룩한 모양(㠅)을 갖는다. 먹을 잔뜩 머금은 묵직한 획도 있고 마지막 남은 먹물이 처절한 비백(飛白)을 남기기도 한다. 먹의 농담(濃淡)이 최고의 조연으로 작품의 ‘변화’에 도움을 준다. 글씨를 쓰면서 획 하나하나가 그토록 소중한 이유다. 각목(角木) 같은 직선보다 자로잰 듯 똑바르지 않아도 산을 지키는 굽은 나무의 줄기에서 ‘한 획’을 얻는 이유가 그것이다. 코랄블루, 샴페인골드처럼 획도 ‘할머니댁 부지깽이 획’, ‘남산 굽은소나무 획’ 등으로 불러져도 좋을 듯하다.
글씨는 단박에 써야 제맛이다. 일필휘지(一筆揮之)로 씌어진 글씨에는 붓과 화선지 간의 밀당이 그대로 드러난다. 종이와 붓이 서로의 모세관 힘을 겨뤄 먹물을 주고 받으며 먹물이 다하는 순간까지 붓이 화선지 위에 머무는 시간과 속도에 따라 다양한 얼굴을 내밀어 글씨 쓰는 사람의 마음을 오롯이 전달하게 한다. 그래서 마음 담은 글씨는 마음을 닮게 되는 것이다.
글씨를 쓰면서 가장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글이다. 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쓴 글씨에서 명작이 나올 수 없고 남의 글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글씨로 옮겼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글씨를 만날 수 있다. 마음을 적고 생각을 쓰는 일. 오감으로 느낀 정보가 체화되어 글로, 글씨로 발현되기를 늘 소망한다.
어느 날 소름이 돋다가 가슴이 아리고 눈물이 나기도 한다. 이성적인 판단을 추구하며 살아온 나에게 눌린 감성이 아직 남아 있음에 감사한다. 말랑말랑한 뇌와 뜨끈뜨끈한 심장이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늘도 글씨를 쓰며 자그마한 변화를 꿈꾼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오늘과 같은 내일이 줄 수 있는 건 그저 언젠가 끝을 보여줄 날을 기다리게 하는 것뿐이다. 우리에게도 변화가 필요하다. 살아 숨쉬는 한.
/ 황성일 먹글씨연구소 대표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