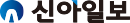꺼내놓았다가 다시 집어넣고, 들었다 놨다, 미련한 내가 미련해서 미련을 떠는 건지 한심하기도 하고 뭐 한다고 이러고 있나 싶기도 하다. 몇 년에 한 번씩 마주하는 것들인데도 마음 한 조각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 애틋하고 서운해 또 슬그머니 밀어둔다.
“버려, 버려!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어 ”
집 정리하는 날, 놀러 온 동생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날 보고 한소리 한다.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많고 버릴 이유는 딱 하나, 쓸 데가 없다. “쓸데없다.” 이 한 문장이면 버릴 이유가 충분한데도 난, 그러지 못하고 산다.
30년 전 엄마가 혼수로 해준 이부자리가 있다. 내 취향과는 다르게 진한 바탕에 주먹만 한 빨간 장미가 활짝 핀 호화스러운 이부자리였다. 엄마가 괜찮냐고 묻길래 강렬한 색채가 거북스러워 시다 떫다 말을 안 했었다. 한마디로 촌스러웠다.
그런데 장미 이부자리를 깔고 덮고 있노라면 장미 넝쿨이 우거진 길을 따라 마차를 타고 들어가면 분수가 축제처럼 뿜어져 나오고 탐스러운 붉은 장미가 호사스럽게 핀,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대저택을 소유한 지체 높은 명문가, 마나님이 되어 화려한 침상에 누운 우쭐한 기분이 드는 희한한 이불이었다. 가난한 엄마가 맏딸을 위해 목화솜을 두둑이 넣어 특별히 주문한 이부자리라 엄마를 생각해 30여 년을 간직했다.
돌아가신 지도 십수 년이 흘렀건만 이불만 보면 엄마 생각이 난다. 엄마가 펼쳐 준 꽃밭에서 가진 것 없이 시작한 결혼 생활, 신랑과 단꿈을 꾸고 아이를 키웠다. 우린 무수히 붉은 희망의 꽃을 피워냈다.
버릴 수가 없었다. 이불은 낡을 대로 낡아서 색이 다 바랬다. 장미는 생기를 잃고 우거진 초록 잎도 시든 지 오래다. 보관만 하다가 몇 해 전에 버릴까 하다가 몽땅 버리면 서운할 것 같아 자구책으로 이불 겉 커버만 버리고 솜은 남겨두었다.
다시 남겨진 이불솜과 마주했다. 누런 흔적이 여기저기 나 있는 영락없는 거적때기를 왜 가지고 있나 싶었다. 미련이 남아 동생한테 솜 틀어서 다시 이불 만들어 쓸까 했더니 한심하단 듯 버리라고 한다. 좋은 이불이 얼마나 많은데 요도 같이 버리란다.
‘그래 버릴 때도 됐지. 세월이 몇 년이야. 쓰지도 않을 거 소용도 없잖아.’ 버리야 되는 이유를 열거하며 나 자신을 설득했다. 70 리터 쓰레기봉투 두 개를 샀다. 최대한 부피를 줄여야 해서 목화솜을 투명 테이프로 칭칭 감았다.
모양이 마지막 가는 길, 염이라도 해놓은 양 처량해 보였다. 보내야 되는데 보내기 싫은 마음, 어릴 적 집에 누가 놀러 왔다가 간다고 하면 보내기 싫어서 가지 말라고 가는 사람 붙들고 보채다, 보채다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 흔들어주던 그때 그 마음 같았다.
마음이 미어졌다. 아직 장미가 피어있는 요를 두고 전전긍긍하다가 옆으로 밀어놓고 말았다. 동생은 눈을 찡그리고 목소리를 높여 버리란 소릴 또 한다. 뭐라 말을 할 수 없었다. 미련 맞은 언니 같아서 눈치가 보였다. 빨리 안 버릴 이유를 찾아야 했다.
순간적으로 쓸모가 떠올랐다. 침대에 스프링 매트리스를 깔지 않고 두꺼운 라텍스 매트만 깔았는데 아무래도 스프링 매트 위에 까는 것보다 침대가 딱딱했다. ‘오호라! 침대에 깔면 되겠구나.’ 바삐 침대에 요를 깔고 그 위에 라텍스를 깔았다. 적당히 쿠션이 생겨 좋았다.
그것보다 요를 안 버려도 된다는 생각에 안도했다. 이번엔 오래된 그릇들을 꺼내놓았다. 얼마 전 그릇을 싹 바꿀 요량으로 좋아하는 캐릭터의 그릇을 샀다. 그릇을 버리는 것은 생각보다 수월했다. 디자인이나 문양이 새로 산 것들이 마음에 더 들었다. 작은 간장 종지가 눈에 들어왔다. 동생 말은 골동품이었다.
내 나이보다 많을지도 모르고 내 나이쯤 됐을지도 모르는 그릇이다. 꽃문양이 새겨진 주름이 곱게 진 투명한 작은 간장 종지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엄마 집에서 가져온 몇 개 안 되는 그릇 중에 하나이다.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가 간장이나 콩장을 담아 주었던 그릇이었다.
깨소금이 동동 뜬 간장을 떠서 밥을 비벼 먹고 달콤한 콩장을 맛있게 먹었던 기분 좋은 기억이 살아있다. 꼬맹이 때부터 보아온 종지라, 애정이 가서 쓰지도 않으면서 보관만 하고 있다. 동생은 감별사처럼 이건 써도 되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이건 안 버려도 되지.’ 지금처럼 쓰진 못할 것 같다. 쓰다가 깨트리면 내 마음도 깨질 테니까.... 고이고이 모셔두고 반가운 친구 대하듯 바라보리라.
이부자리랑 간장 종지가 별거라고 이렇게 글을 쓴다. 왜 그렇게 사냐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남들 눈에는 하잘것없어도 내겐 별거인데 어쩌란 말인가. 쓸데없다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엄마가 펼쳐준 꽃자리는 내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담겨있고 작은 종지에 담긴 그리움과 사랑은 절대 작지 않다.
생각해 보니 버리지 못하는 이유 끝에는 그리움이 있었고 추억이 있었다. 동생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많은 것들은 쓰레기가 됐지만, 종이 쪼가리 하나라도 내게 의미 있는 것은 절대 버리지 않았다. 누구는 궁상맞다고 할지도 모른다.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니 말이다.
삶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그러나 보다 하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의미가 있는 것들은 기억이 살아있다. 누군가 기억 속에 살아있는 것은 쓸모가 다해도 쓸모가 없어도 가치가 있다. 버리지 못하는 이유이다.
/김형주 작가(수필가)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