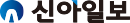과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KT를 이끌던 남중수 사장이 검찰에 구속 된 후 사퇴했다. 그러자 포스코에선 이구택 회장이 임기 1년이 남았음에도 사퇴했다.
포스코와 KT 민영화 이후 총수는 이렇게 사라졌다. 그런데 이를 시작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리를 지키는 총수가 보이지 않았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이번엔 KT 이석채 회장이 검찰수사를 받고 사퇴했다. 포스코 정준양 회장은 임기를 채우지 않고 떠났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KT 황창규 회장은 쪼개기 후원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포스코 권오준 회장은 임기가 2년이나 남았음에도 자리에서 물러났다.
경제에 포커스를 맞춘 현 윤석열 정부는 어떨까. 올해 연임을 노리던 KT 구현모 사장은 오는 31일 임기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현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임기 1년이 남았지만 검찰의 수사 칼날이 그를 향하기 시작했다.
이 정도면 정부 산하기관으로 착각이 들 정도다. 현 권력에 맞춤 인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이 명백해 보이기 때문이다.
KT는 구현모 사장 뒤를 이을 윤경림 차기 대표 후보도 27일 잃게 됐다. 윤 후보는 이날 공식적으로 후보 사퇴의사를 밝혔고 이사회가 이를 수락했다. 윤 후보는 외부 자문단 심사와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면접을 거쳐 지난 7일 KT 이사회에서 단독 후보로 확정된 인사다. 오는 31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정권 압박을 이기지 못한 모양새다. 주총 찬반 표결도 하지 못할 만큼 부담이 컸던 것으로 업계는 해석했다.
앞서 KT 구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2번이나 연임 적격 판정을 받고도 연임에 실패했다. KT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디지코)’으로의 전환을 이끌며 실적도 키워내는 성과를 올렸음에도 말이다. KT 이사회는 그나마 ‘디지코’ 사업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윤 후보를 선택했지만 정부는 거의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렇게 3번째 후보까지 낙마시킨 것이다. 이쯤 되면 어쩔 수 없이 친정부 인사다. 그나마 KT와 IT업계 쪽에 몸담았던 정치권 인사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IT특보를 지냈던 인사까지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권은희, 김성태, 윤진식, 김기열 등이다.
KT의 답이 정해지면 그 다음은 항상 그랬듯 이번에도 포스코 차례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임기는 2024년 3월까지다. 문재인 정부시절 한차례 연임에 성공한 최 회장은 나름 성과를 꽤 냈다. 세계철강업계의 탄소중립을 리딩하고 이차전지소재사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이뤄냈다. 최근엔 정치적 문제로 확산되던 지주사 본점 소재지 이전 문제까지 매듭지었다.
이에 더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자발적 기금 40억원을 국내기업 중 가장 처음으로 출연, 현 정부에 발을 맞추겠다는 모습을 온 몸으로 보여줬다. 포스코 최초 임기완주 회장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그러나 최정우 회장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면 가장 큰 걸림돌은 태풍 ‘힌남노’ 사태로 인한 리더십 문제다. 지난해 9월 ‘힌남노’ 타격에 제철소가 중단되며 조 단위의 손실을 봤고 이를 둘러싼 최 회장 책임론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다.
이에 더해 국세청은 이달초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자금시장법 위반 혐의다.
이로 인해 이미 정치권에선 포스코 차기 회장 후보까지 나돌고 있다는 후문이다.
전 정권에서 총수 직에 오른 KT와 포스코의 CEO는 결국 안 된다는 것일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려지는 이들 기업에 대한 답이 보이지 않는다. 5년에 한번씩 똑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권을 잡은 정부는 변함이 없다.
그렇다고 시스템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깐깐한 ‘오픈 경선’을 벌여도 마지막에 정부가 압박을 가하면 이번처럼 소용이 없다. 재계 6위, 12위의 포스코와 KT의 총수를 기관장급으로 바라보는 것일까?
현재로써 방법은 하나다. 최대주주 개미들(소액주주들)이 뭉쳐 정부와 맞짱을 떠주는 것이다. 주총까지 가야 하는 이유다. 기업은 기관이 아닌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곳이다. KT는 무릎을 꿇었지만 최정우 회장은 살아 있다. 기관장이 아니란 걸 끝까지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