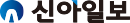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친 것도 벌써 수 년 전 일이고 '청년 고통지수'라는 게 있을 정도로 요즘 청년들은 삶 자체가 고단하다.
필자가 청년 시절이던 80년대는 최소한 경제적인 면에서는 참 좋았다. 높은 경제성장 덕분에 취직도 '마음먹기' 나름이었고 집값도 지금에 비하면 '거저다' 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직장 있고 집 구하기도 어렵지 않았으니 결혼은 서른 이전에 거쳐야 하는 '필수코스'였었다.
그러나 호황도 잠깐. IMF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취직은 '절벽'이요 집값은 '넘사벽'이니 결혼은 경제사정에 따른 '옵션(선택)'이 되어버렸다.
작년까지 4년 동안 청년 실업률(20~34세)은 13%대에 이르렀다. 코로나19로 인한 체감 실업률은 올 9월 25.4%로 치솟았다. 작년 말 3.5%였던 미국 실업률이 코로나19로 올 2분기 13%대까지 치솟은 것과 비교하면 청년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된다.
최근 한 비영리 청년단체로부터 금융사기에 관한 강연 요청을 받았는데 주로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다. 참 솔직하고 소박한 질문이라는 느낌과 함께 요즘 청년들의 당당하고 구체적이며 때론 당돌하기까지 한 질문에 적이 놀랐었다.
질문의 행간에서 질문한 청년들의 저간의 사정을 짐작할 만한 내용도 있었다. 늘어난 신용카드 할부대금 고민에서부터 당첨률도 낮은데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을 계속 부어야 하는지, 금융을 체험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보는 건 좋은 방법인지 이런 내용이었다. 은행 창구에만 가면 식은땀부터 난다는 청년도 있었다.
금융의 핵심 요소는 신용이다. 신용을 매개로 유동성을 창출하는데 있어서 신용평가를 수단으로 한다. 그런데 이 신용평가라는 것이 과거의 신용거래 이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청년들은 아직 이런 신용거래 이력이 없거나 부족하다. 자연히 금융접근이 쉽지 않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 내역, SNS 정보 등 비금융정보만을 이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대안신용평가가 요구되고 필요한 계층은 주로 청년들이다. 작년 말 빅데이터 3법이 통과되었지만 아직 이 분야의 진행속도는 느리다.
근본 원인은 대출 과수요에 있다. 은행 입장에서야 지금의 금융정보 기반의 신용평가 시스템으로도 빌려줄 고객이 넘치는데 굳이 틈새를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저축은행과 같은 상대적으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들의 경우는 대안신용평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여지가 있다.
대안신용평가와 관련한 핀테크 기업들이 수 년전부터 관련 플랫폼을 준비해 왔고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안다. 정부는 법을 제정해 제도를 만든데 그치지 말고 산업이 성장하도록 마중물을 부어주어야 한다. 진입장벽을 제도로 만들려 하지 말고 시장의 경쟁에 맡겨두는 것이 더 효율적임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년기본법은 정부와 지자체에게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하고 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외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