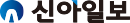민간기업 아닌 조합 특성 한계…"재발방지 위한 상시 교육·협의"
![어느 마트에 진열된 서울우유 제품. [사진=박성은 기자]](/news/photo/202412/1979503_1097720_5145.jpg)
서울우유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을 근거로 낙농업을 영위하는 조합원 중심의 단체다. ‘서울우유’라는 전국 단위의 인지도 높은 브랜드 파워 덕분에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 민간 유가공기업을 제치고 유업계 1등으로 자리매김했다.
아쉬운 측면도 있다.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달리 마케팅 면에선 예기치 않은 ‘헛발질’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면서 스스로 명성을 깎아 먹는 일들이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19일 유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는 올해와 2021년 전개한 일부 마케팅 활동에서 ‘여혐(여성혐오)’ 등 젠더 논란이 불거졌다.
올 들어 서울우유의 여혐 논란은 신제품 ‘더진한 그릭요거트’ 마케팅 캠페인에서 비롯됐다. 신제품 홍보 차원에서 인플루언서들에게 준 안내사항에서 “요거트 뚜껑을 열거나 패키지를 잡을 때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손동작 사용 주의를 부탁한다”라는 문구가 문제의 발단이 됐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손동작은 엄지와 검지로 물건을 집는 집게 손 모양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남성의 특정 부위 크기를 조롱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남혐(남성혐오)’ 논란의 대상이 됐다. 3년여 전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의 홍보 포스터가 이 같은 논란에 휩싸여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그 여파로 담당 임원 및 책임자 등이 자리에 물러났고 이는 다시 여혐 논란으로 번지면서 GS25는 한동안 불매운동으로 곤혹을 치른 바 있다. 서울우유는 대조적으로 집게손을 사용하지 말라는 주의사항을 안내했는데 되레 이를 두고 여혐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서울우유는 과거 사례가 있다 보니 행여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는 입장인데 의도와 달리 소통 과정에서 괜한 오해를 빚은 꼴이 됐다.
2021년 말 이른바 ‘젖소 여혐 논란’은 사회적 파장이 무척 큰 사례로 꼽힌다. 당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보인 유기농우유 광고에서 모델로 나온 여성들을 젖소로 변하게 하는 장면들이 여성 혐오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서울우유는 거센 비판에 부랴부랴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공식 사과문을 게시했다.
서울우유는 앞서 2003년 요구르트 신제품 마케팅을 위해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을 출연시켜 공분을 산적도 있다. 이 사건으로 당시 서울우유 마케팅팀장과 홍보대행사 대표, 연출가 등이 모두 공연음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우유가 인플루언서들에게 그릭요거트 신제품 홍보를 안내하면서 보낸 주의사항 안내문.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쳐]](/news/photo/202412/1979503_1097723_548.jpg)
업계 1위라는 명성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전력들은 서울우유 브랜드 이미지에 괜한 발목을 잡고 있는 격이다. 일각에서는 민간기업과 달리 조합 특유의 경직된 조직 분위기,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마케팅 트렌드를 세심하게 읽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마케터 출신의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경쟁사들은 서울우유처럼 젠더 논란에 크게 휩싸인 적이 없었다”며 “민간기업이 아닌 낙농가로 구성된 협동조합 특성상 상대적으로 남성 구성원 비중이 높다는 전제 하에 젠더 등 사회 전반의 이슈와 분위기에 무딘 것이 이런 결과들을 낳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발방지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관련 협의 및 교육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마케팅 등의 전문인력 배치와 관련해서는 “(마케팅을 비롯한 부서) 인력 운용은 업무역량, 가치관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 배치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부문이 아닌 같은 부문 내 이동으로 순환보직 장점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이전 근무 부서로의 이동도 잦은 편이라 해당 업무에 대한 개인 전문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