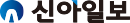서울시가 역사 문화재 등으로 쓰지 못한 건물의 용적률을 다른 건물이나 지역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용적이양제(TDR)'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도심재개발 활력 제고를 위한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 용역을 내년 2월 발주할 예정으로 서울시는 용역을 통해 실제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는 곳을 찾고 용적률 가치나 거래 방식을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로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을 얼마나 높이 크게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 1000㎡ 땅에 용적률이 250%면 연면적 2500㎡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건폐율 50%가 적용된다면 바닥면적이 500㎡인 5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용적률이 500%라면 연면적 5000㎡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 바닥면적 500㎡ 10층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서울에는 부동산 국가지정문화재 982개 중 237개인 24.1%가 몰려 있고 사대문 안에는 113개나 밀집돼 있다. 문화재 주변 지역은 건축물 높이 규제를 받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많아 법으로 보장된 용적률만큼 건축물을 짓지 못해 개발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꼽혀 왔다.
용적률을 거래하는 용적이양제는 갑자기 뚝 떨어진 정책이 아니라 이미 미국, 일본 등 해외에는 도입한 사례가 있다.
1913년에 지은 미국 뉴욕 맨해튼 그랜드 센트럴역은 역사보존법으로 지정된 문화재이기 때문에 역 주변 지역은 재개발 증축이 불허됐는데 1963년 팬암항공이 그랜드 센트럴역 공중권(용적률)을 사서 역 주변에 59층(246m) 고층빌딩을 지었다. 일본은 도쿄 역사 인근 저층부 건물 높이를 기존 31m로 유지하면서 역사 뒤로 고층 복합개발을 추진했다.
문화재 등으로 용적률을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 건물의 용적률을 사서 고층 개발을 한다는 아이디어는 참신하지만 현실화되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우리나라도 2016년 일정 거리 안에 있는 토지, 건축주끼리 서로 합의해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는 '결합건축제도'가 도입됐지만 상업지역 등 용도지역에 대한 제한이 있고 건물과 땅값이 달라 평가 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거래가 쉽지 않아 호응을 얻지 못했다.
용적이양제가 성공하려면 다음 다섯 가지 관문을 넘어야 한다.
첫째, 용적률을 사고팔기 위한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둘째, 돈을 주고 용적률을 구입하더라도 고도 제한, 경관지구 등 건축규제를 피할 수 있어야 한다. 기껏 돈을 주고 용적률을 샀는데 건축심의에 막혀버리면 성공할 수 없다.
셋째, 지역 간 평형성, 양극화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돈 많은 지역에서 돈을 주고 고층 개발을 독점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진다. 넷째, 용적률 구입으로 인한 개발비용 상승으로 분양가 상승 압력을 억제해야 한다.
다섯째, 정책의 일관성으로 만약 서울시장이 바뀌었을 경우 그대로 추진돼야 한다. 과거 성수전략정비구역 50층 건축이 서울시장이 변경되면서 35층으로 기준이 바뀌면서 무산된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된다.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화하는 서민들의 주거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