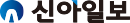불과 1년 전,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추종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를 잣대로 은행권에 손실 배상을 지시했지만 최근 상황이 급변했다. 트럼프발 관세 정책 파장과 중국 딥시크 효과로 홍콩H지수에 다시 투자 뭉칫돈이 몰리고 있는 것. 금융당국의 투자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판단과 그에 따른 배상 후폭풍이 드리우고 있다. <편집자주>
최근 홍콩 상장 중국 본토 기업들로 구성된 홍콩H지수가 9000선을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하며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지만, 국내 시중은행 지점에서는 홍콩H지수를 추종하는 ELS에 가입할 수 없다.
지난해 4조6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액을 기록하며 개인투자자 피눈물을 쏟게한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로 판매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또 금융당국은 후속 조치로 일부 거점 점포에서만 ELS를 판매하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다만 지수 급등 등 반전 상황에 따라 ELS 판매 규제 강화가 외려 투자자 선택권과 편의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3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앞서 18일 홍콩H지수는 9177.80포인트(p)로 장을 마감하며 2021년 10월 이후 40개월 만에 9000대를 돌파했다.
이는 중국의 경기부양 정책과 딥시크 등장 등 증시 주도 업종이 된 인공지능(AI) 분야 중국의 영향력을 확인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 조치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미국 증시 불확실성은 키우고 중국 증시에 대한 낙관론이 형성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홍콩H지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50일간 21% 급등했다. 같은 기간 미국 증시 벤치마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약 7%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외면하던 국내 투자자들도 눈을 돌리고 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월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홍콩 주식 순매수 규모는 1억8900만달러(약 2753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2년 3월 이후 최대치다.
지난해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 따라 조단위 배상을 감행한 은행은 허탈하기만 하다.
은행권에서 홍콩H지수 E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3조2518억원을 기록하며 은행 순위 3위로 밀려났는데, 이는 ELS 손실 배당에 따른 충당금이 주효했다.
실제 지난해 1분기 기준 은행별 충당금 규모는 KB국민은행이 86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2407억원 △하나은행 1799억원 △우리은행 75억원 등의 순이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홍콩H지수가 하락했을땐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배상이 이뤄졌는데, 지수가 상승하자 다시 투자자들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허무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더욱이 지수 하락에 따른 저평가 시기 은행권 판매는 중단됐다"고 짚었다.
더 큰 문제는 금융당국의 판매 강화 조치다.
앞서 2월 금융위원회는 '홍콩H지수 기초 ELS 현황 및 대책'을 발표했다.
은행권 ELS 판매를 지역별 소수 거점 점포에만 허용하고 ELS 상품을 권유할 수 있는 적합 고객군을 미리 정해 부적합한 경우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전액 손실 감내 가능'에 동의한 고객 등은 판매가 제한된다. 65세 이상 고령일 경우 ELS 가입에 가족 확인 과정도 마련된다.
소비자 보호장치 갖춘 거점 점포에서도 은행 직원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는 분리된 투자 창구에서만 가능하다.
금융위는 3월 관련 규정 개정, 4월 은행 거점 점포 마련과 자체 점검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ELS 판매를 본격 재개할 예정이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책은 위험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소비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리스크를 모두 감수하겠다 규율이 생기는 셈"이라며 "다만 정책을 설계할때 리스크,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해당 내용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소비자 편의성 및 접근성 문제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