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사진=연합뉴스]](/news/photo/202210/1607049_780076_524.jpg)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된 식욕억제제를 평균보다 1000배 이상 많이 처방하는 의료기관이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실정이다.
5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충청지역 A 가정의원과 수도권 B 정신과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연평균 각각 19만4000여건, 25만6000여건을 처방했다.
의료기관 1곳당 연평균 처방건수가 약 249건인 것을 고려하면 780배에서 1020배에 달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량 연평균 값의 약 7%에 이른다.
두 의료기관의 처방 환자 수도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A 의원은 3년간 연평균 3만3000여명의 환자에게, B 의원은 연평균 2만3000여명의 환자에게 각각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했다.
의료기관 1곳당 연평균 처방 환자 수가 약 53명인 것에 비춰봤을 때 A 의원은 600배 이상, B 의원은 400배 이상 많았다.
문제는 의존성이나 내성 위험이 있어 마약류로 분류됐음에도 식약처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두 의료기관에 대하 현장실사나 지도·감독을 시행하지 않았다. 식약처가 올해 4월 제정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정고시’에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다량의 식욕억제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감시를 규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란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고시에는 식욕억제제 처장·투약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2종 이상의 식욕억제제를 병용한 경우, 청소년·어린이에게 투여한 경우에만 현장 감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고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의료 쇼핑 의약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식약처가 단순히 환자 1인당 처방량 같은 소극적인 방지 기준이나 단속 기준을 정할 것이 아니라 과하게 많이 처방되고 있는 의료 현장을 더 확인하고 점검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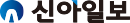

![[마감시황] 코스피, 외국인 10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하며 상승](/news/thumbnail/202411/1965738_1086081_4853_v1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