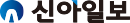한 여름 불볕더위처럼 뜨겁게 달아오르더니 ‘이게 아닌가’ 싶은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얘기다.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의 후폭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탄소중립’·‘친환경’은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다. 스테그플레이션 공포가 전 세계를 짓누르면서 ‘경제 안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그간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한 탄소중립에 적극적이었던 유럽 국가들도 석탄 발전을 비롯한 화석연료 공급을 다시 늘리는 조치를 단행했다. 전기차 회의론이 제기됐고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국가들도 나타났다. ESG 투자 열풍을 선도하던 세계 최대의 투자운용사인 블랙록은 올 상반기 투자기업들의 연례 주주총회에서 환경·사회 이슈 관련 주주 제안 중 무려 76%에 반대표를 던졌다.
우리나라도 새 정부 출범 이후 분위기 전환이 읽힌다. OECD 37개국 중 최하위인 재생에너지 사용률(2021년 기준 8.6%)을 끌어올리는 대신 원전 재가동과 원전 활용률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기존 탄소중립 계획의 방향과 속도에 대한 큰 틀의 수정이 이뤄지는 기류다.
표면적으로는 거침없던 ‘ESG 대세론’에 브레이크가 걸린 모양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외에서 급작스럽게 과열됐던 분위기의 조정국면이다. 미국 주도의 러시아, 중국 포위전략에 따른 신냉전시대 개막, 세계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이 미래의 기후 대재앙과 ‘집단 자살’ 경고보다 ‘눈앞의 에너지 안보’를 훨씬 무겁게 받아들이게 하는 기류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ESG 경영의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는 일이다. 과도하게 부풀어 올랐던 거품이 빠지는 일련의 흐름을 오판, ESG가 한 때의 반짝 유행처럼 사라지거나 무력화될 것으로 치부한다면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는 격이 될 것이다. 장기적 시각을 갖고 미국과 유럽 등의 ESG 무역장벽 강화와 규제 드라이브에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이야말로 ESG 경영에 대한 개별 기업들의 진정성과 실행력을 평가할 수 있는 단계다.
ESG 조정 국면에도 ESG 공시 의무화와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등 큰 흐름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ESG가 한층 중요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전망이다. 비재무적인 ESG 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공개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상장 기업들에 대한 ESG 공시 의무화는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자산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들에 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 의무가 부과된 데 이어 2026년에는 모든 상장사로 확대된다. 2030년에는 모든 상장사가 지속가능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등 그 폭과 속도가 뒷걸음치기는 힘들 전망이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에도 ESG 경영은 직면한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국제적인 규제 강화와 함께 ESG 가이드라인이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활로를 찾아야 하는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철저한 대비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한국생산성본부는 EU와 독일 등에서 추진 중인 환경, 인권 등에 대한 공급망 실사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발효되면 제약바이오산업이 반도체산업 등과 함께 가장 먼저 영향권에 들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제약바이오산업계가 현재의 ESG 조정국면을 안일하게 판단해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 선제적으로 ESG 이슈를 해결함으로써 미래의 위기 상황을 기회로 만드는 발상의 대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무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