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타이밍 이기적 결단에 MSCI 매수 비중 확대 철회 불러
'이미 공적자금 이상 회수' 과도한 이익 추구 적정성 우려 비등
18일의 블록딜 비극이 드디어 끝났지만, 예금보험공사의 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20일 금융계 안팎에서 나오는 모습이다.
지난 19일 우리금융 주가는 전장 대비 4.7%(700원) 밀렸다(1만4200원). 이는 예보가 18일 주식시장 개장 전 블록딜을 통해 우리금융 지분 2.33%(1700만주)를 매각한 상황과 그 파생 사정이 빚어낸 복합 상황이라는 평가다. 예보의 돌연한 블록딜에, 외국에서도 모호한 반응이 뒤따랐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온 덕에 이제 거의 막판이었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매수 비중 확대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우리은행에서 일어난 이란 대금 횡령 논란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러브콜이 이어졌었다. 견조한 모습을 보였던 우리금융 주가는 이번 MSCI의 변심에 타격을 받았다. 결국 19일 주가 하락은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돌아선 탓이 크다는 평가다.
물론 20일 상승 반전으로 우리금융은 이런 하락폭을 모두 극복하는 저력을 보였지만, 예보의 블록딜 문제는 어쨌든 상처로 남을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이제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 잔여 지분은 기존 3.62%에서 1.29%로 낮아졌다. 2.33%를 던져 이렇게 야단이 났었다고 숫자 계산상으로만 생각하면 이제 입을 충격파는 그만큼 작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심리'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MSCI 비중 상향 취소에 대해 "예보의 블록딜이 배경으로 추정된다"고 짚었다(반대 의견 있음: 예를 들어,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 아울러 고 연구원은 "1277억원의 리밸런싱 수요를 기대했던 자금의 이탈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음 한 번 고비만 넘기면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너무 큰 리스크라는 비판이 대두된다. 미국발 강한 긴축 바람을 타고 금융권이 힘든 투쟁을 해야 하는 때다. 언제 또 이런 문제가 부각될지 곤란하다는 시각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지는 것은 별반 좋은 현상이 아니다.
물론 예보 행동이 이해를 살 구석이 0%인 억지는 아니다. 사정을 짚어 보자. 예보 측의 우리금융 지분 매각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예보는 지난 2월 우리금융 지분 2.2%를 처분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우리금융 완전민영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올해까지 예보가 소유한 지분을 전량 매각키로 계획을 세웠다. 이게 어그러지면서, 결국 지분을 생각대로 처분하지 못했다고 볼멘 소리가 나올 법하다. 이제서야 주가가 호조이니 기회를 십분 활용하자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지난해 4월의 비극도 문제다. 정부는 지분 처분 계획을 지켜야 하기에, 손해를 감수하고 지분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속이 탄 예보로서는 이번 호조 국면에서 급히 블록딜을 단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써 예보 행동이 모두 정당화되는 건 분명 아니다. 최근까지 주가가 문제가 된 배경을 도외시한 설명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라는 글로벌 비상 국면으로 우리금융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결국 지분을 매각하지 못했던 지체 사정 등을 이번에 가격 벌충이 가능해 뵈니 몰아붙인다고 단순도식화해서 나서면 좀 심하지 않냐는 것이다.
올해 들어 우리금융 주가는 급등했다. 올 초 1만2800원을 기록했지만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꾸준히 올라 최근 1만5000원선을 보여 왔다. 사정이 이렇고 보니, 우리금융이 지주사 체제로 다시 출범한 직후 주가(1만5300원) 수준으로 원상복귀된 셈이라고 흡족해 할 수도 있다. 예보로서는 우리금융 주식을 파는 데 별다른 어려움 내지 거리낌이 없었을 수 있다.
이번 18일의 매각으로 예보는 공적자금 2589억원을 회수했다. 그 결과 우리금융으로부터 회수한 공적자금 규모는 총 12조8658억원에 달한다. 지원 원금 12조7663억원 대비 약 1000억원을 초과한 규모다. 오랜 시간을 지체했고, 시달린 값 내지 고급인력들의 두뇌회전에 들어간 품값이 얹혀졌다고 해도 많다는 평이 없을 수 없다. 더욱이 이번 매각으로 예보의 우리금융 잔여 보유지분은 0이 된 것도 아니고, 1.29%가 남는다.
'본전치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빠르게 정리하면서, 한국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MSCI 비중 확대 건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필요가 컸는지 냉정한 사회적 합의가 뒤늦게라도 수행되어야 할 필요는 남는다는 비판이 대두된다. 더욱이 예보는 오랜 시간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간섭 논란 등을 빚어왔다. 김주현 전 예보 사장이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소장 자리를 차지한 '자체 낙하산' 행보를 보인 적도 있었다. 김 전 사장은 관료 출신으로 우리금융 민영화 조치라는 명분으로 잘 나가던 우리투자증권을 분리매각해 버리는 데 주요 역할을 한 인사이기도 하다. 이렇게 처리한 여파 때문에 우리금융은 이제 다시 인수합병(M&A)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그런 그가 공무원과 예보를 거쳐 우리금융 내부에 자리를 얻었으니, 상당한 치욕이라는 풀이가 많다. 그는 이후에도 유관 기관 자리를 누리고 있다. 현재 여신금융협회장으로 가 있고, 일각에서는 금융위원장감으로 거론하기도 한다.
우리금융 주가는 씩씩하다. 우리금융을 분석한 하나금융투자의 20일자 보고서는 "2분기에도 순이자마진(NIM)은 은행 중 가장 높은 10bp 가량 상승해 가파른 마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2분기 추정 순익도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예보의 추가 문제 일으키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하나금융투자 보고서는 보태고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다만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지분 3.6% 중 2.3%(17백만주)를 3.0% 할인된 가격에 블록딜 매각하는 과정에서 전량 매각하지 않고, 잔여지분 1.3%를 남겼다는 점은 다소 아쉽다"고 지적한다. 초과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분을 남김으로서 오버행 우려를 지속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러모로 '청개구리 행보를 보이는 예보 측 행동'을 꼬집은 셈이다. 우리금융 뿐만 아니라 한화생명이나 서울보증보험 관련 공적자금 회수 문제에선 예보가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한다는 비판이 과거부터 있었다. 일 잘하고 만만한 상대에게만 '방구석 여포 노릇'을 할 책무나 권한이 예보의 본업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여러 공적자금 이슈와 우리금융 잔여분 처리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아일보] 임혜현 기자
dogo8421@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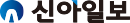

![[마감시황] 코스피, 외국인 10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하며 상승](/news/thumbnail/202411/1965738_1086081_4853_v150.jpg)